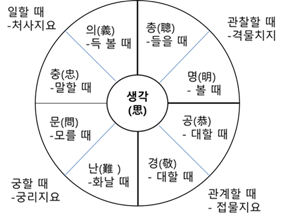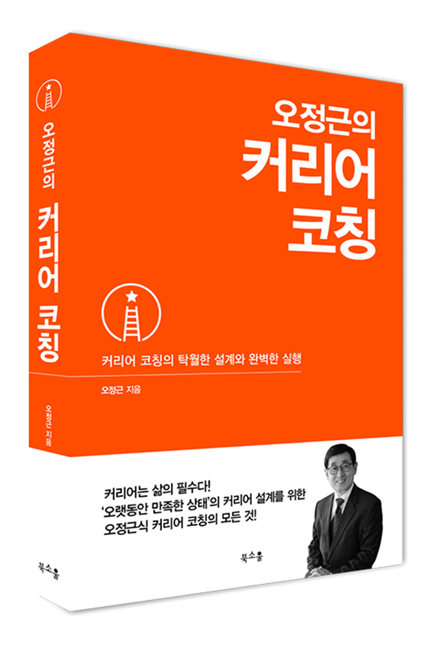[한국강사신문 오정근 칼럼니스트] 호기심이 많던 둘째 딸아이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물었다.
“목사는 목사님, 신부는 신부님이라고 하면서, 왜 중은 중님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 질문 덕에 나도 새삼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일단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주었다.
“그 대신 중한테는 더 점잖게 스님이라고 부른단다.”
그러자 아이는
“아 그럼 원래 중이 아니라 스야?”
하고 묻기에 깔깔 웃었던 기억이 난다. 잠시 후 나도 스님이란 호칭이 생긴 까닭이 궁금해졌다. 아마 승(僧, 승려僧侶)에서 온 말인 것 같았고, 승님으로 호칭하다가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스님으로 이응(ㅇ) 받침이 탈락된 것 같다고 둘러댔다. 그 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니 검색을 바로바로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중이란 말은 어떻게 생긴 말일까? 혼자 공상을 하다가 이렇게 추론했다. 어떤 꼬마가 부모 따라 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저씨는 뭐하는 분이세요?” 하고 묻자 어떤 스님은 “공부하는 중입니다.” 했고, 공양간에 스님은 “밥하는 중입니다.” 했고, 밭에서 만난 스님은 “울력하는 중입니다” 하자 꼬마가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은 모두 중이구나!” 했다는 설을 뇌피셜로 지어낸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하는 중일까?’ 하는 질문을 하다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로 꼬리를 문다. 지금은 글을 쓰는 중이지만, 늘 현재의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는 중’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호칭에 매우 민감하다. 왜냐하면 호칭에 따라 존대 받는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코칭 첫 세션에서 참가자를 처음 만나면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묻고 시작한다. 대답을 듣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이름을 불러주세요”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만일 이름 불러주기를 원하면 이름 뒤에 님자를 부쳐서 부른다. 한 번은 ‘이 하나’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이름으로 불러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빵 터지는 순간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언가요?” 하고 묻다가 내가 그 사람 대답을 묻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답을 묻는 것인지 헛갈려 하면서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내 수업을 듣는 60명 넘는 대학생들 이름을 일주일이면 모두 외워서 불러준다. 어떤 학생은 ‘제 전공교수님은 4년 가까이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데 일주일만에 이름을 불러줘서 감동했다’는 말도 전해준다. 반면에 사회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 악수를 하면서 이름을 소개하지만 나는 금세 잊어버리는 편이다. 왜냐하면 이름을 말하면서 발음이 또렷하게 들리지도 않고, 상대 이름을 부를 생각도 별로 없으며, 이미 성과 호칭을 부르기로 마음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은 이름을 잘 외우면서 친숙하게 부른다. 호칭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김춘수님이 꽃이란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듯이 이름이야말로 존재 자체다. 사실 호칭은 존중의 뜻을 담고 있지만 서열을 구분 짓는 수단으로 작동하다 보니 심리적 거리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기업조직이나 워크숍 같은 현장에서 서양식 이름 혹은 닉네임을 만들어 부르기도 하지만 보석과 같은 진짜는 감춰두고, 고유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작 아이를 혼낼 때 보면 갑자기 성姓)을 붙여 이름 석자를 힘주어 부르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일깨우며 정신 차리라는 뜻일 게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호칭의 비중이 크다. 고백하건대 호칭을 틀리게 부를까봐 대화를 주저했던 적도 적지 않다. 호칭이나 허례에 얽매이지 않으면 세대간 소통이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성을 빼고 이름에 님자만 붙여 불러도 아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s://www.lecturernews.com)